감성200%인간형 여행일기. "방콕, 핑크빛."


누군가는 핑크빛이라는 말에서
쑥쑥한 연애의 감정을 떠올릴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저 소녀적인 취향의
파렛속 물감색을 떠올릴 것이며
또 누군가는 자기만의 핑크빛 무언가를 떠올릴게다.


나에겐 방콕이 핑크빛이었다.
숨쉬기도 힘들만큼 온 기관지를 눌러오는 무더위와
까아만 피부색의 사람들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느껴지던 핑크빛의 그 무엇.
처음 공항에 내려서 열기를 마주할 때도
그냥 앉아서 시간과 마주할 때도
웃고 떠들며 사람들과 마주할 때도
나에게는 예의 그 핑크빛 감성이 사무치도록 절절히 다가오는 것이었다.

방콕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의미일 것이다.
송크란이라는 신나는 축제로 기억되거나
향락의 도시이거나 물가 싼, 놀기 좋은 도시이거나
첫 배낭여행지의 설렘이거나, 팍치 한 조각의 씁씁함이거나,
-이유를 다 대기엔 너무 막막하리만치
다양한 의미일 것이다.
색깔로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정의내리기 힘든 거대한 것을,
간략하고 강렬하게 나만의 것으로 재정의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오란 핑크빛.
노란색 간판이나, 황금색 왕궁이나, 핑크빛 택시들을 넘어서
핑크색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그저 따뜻한 핑크빛의 도시.
특별히 핑크색의 무언가가 많진 않았지만 도시를 전망하고 눈감으면,
아롯이 떠오르는 그 무엇은 핑크빛 이었다.



왜 이 도시가 핑크빛으로 정의되는지,
내게 ‘이유를 대봐!’ 한다면
...조금 곤란할 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방콕은 노오란 핑크빛이야”라고 말하면
방콕을 지나쳤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렸다는것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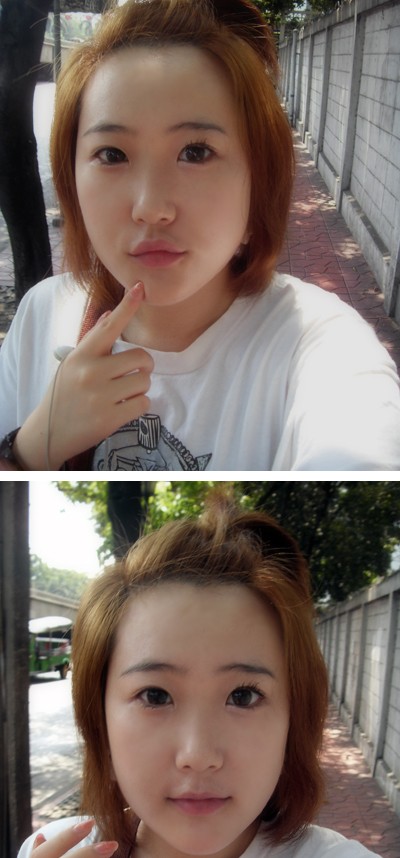
(나도 하얀 시절이 있었다. 처음 방콕 도착 했을 때 인증)
나는 한달 간 방콕에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이지만
한 도시를 내맘대로 평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짧은 시간이었다.
일년, 아니 오년쯤 흘러도 방콕의 실체(?)를 파악하거나
방콕이 방콕시민들에게 어떤 느낌일지 알 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화려한 도시 속에 ‘깜찍하게’ 숨어있던 사람냄새와
살갗을 따갑게 만들면서도 바라보면 따뜻해지던 햇볕과
팍치처럼 톡 쏘는 매력이 마음을 콕콕 찌르던,
무더위와 소음이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던,
지금도 눈감으면 아스라이 펼쳐지는 핑크빛의 이 도시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다.



-덧붙임- (왕궁안에서 짧은 생각)
동남아 어느 곳에서나 부디스트들을 마주하면 경건한 마음이 든다.
나는 부디스트는 아니지만,
부디스트를 아니 모든 종교인들의 심정을
내 나름대로 추정하고 이해해보려 했다.
신의 존재는 중요치 않다.
다만, 절대적인 것에 의지함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것을 통해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생이 조금 더 , 인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추정해 볼 뿐이다.


(카오산 로드에서- 멍멍아 안녕 ^*^)
“더 좋은 잔디를 찾다가 결국 어디에도 앉지 못하고 마는 역마의 유랑도 그것을 미덕이라 할 수 없지만 나는 아직은 달팽이의 보수와 칩거를 선택하는 나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마살에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며 바다로 나와버린 물은 골짜기의 시절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옷자락을 적셔 유리창을 닦고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는 준비가 곧 자기를 키워나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중 일부입니다. 한달여간 집에 있었더니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옥살이하는 사람의 절절한 외침(?)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 역마살’ 하시는 분들이겠지요. 회원님들께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 문구, 혹은 자신에대한 정당화를 할수있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