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성200%인간형 여행일기. "4시, 치앙마이"

치앙마이에는 특별한 공기가 있다.
불쾌하게 온몸을 옥죄는 후덥함과는 다른, 치앙마이만의 기분 좋은 따뜻함.

나는 치앙마이의 모든 시간을 사랑했다.
하늘빛이 도시를 아우르는 아침의 시간,
노오란 조명빛이 도시를 조망하는 늦은 오후의 시간,
그리고 쨍-한 햇볕이 따갑다가도,
선물처럼 시원한 바람이 훅- 불어오는 낮 시간.
낮시간에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은 정말 선물처럼 느껴져서
바람이 불어오면 멈춰서서 헤- 하고 바보처럼 서있기도 했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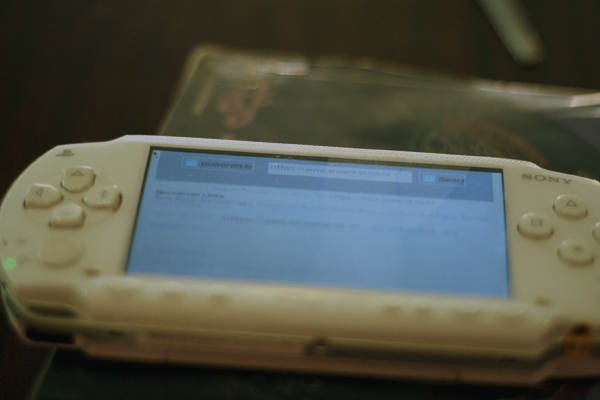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한껏 누리곤 했다.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에 독서 .
(에쿠-_-; 사실 게임을 더 많이 하긴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도 4시-5시, 해가 도시에 가깝게 떨어질때는 부리나케 타페게이트로 달려갔다.
나는 냄새에 민감한 편이다.
무슨 땀냄새 이런게 아니라, 일요일 아침냄새라던가 월요일 저녁 냄새
서울냄새, 부산냄새처럼. 강하진 않아도 손끝 발끝까지 느껴지는 향취에 민감하다.
(우연인지 쥐스킨트의 ‘향수’까지 다시 읽고 있었다!)

빨간 성태우, 사람, 부앙- 장난스럽게 달리는 뚝뚝이들.
모두가 그림이 되고 향기가 되는 그 시간.
기분좋은 따스함.
마음을 위로해주던 다홍빛의 햇살.
..물론 다른사람이 보면 길거리에서 몸을 쭉-펴고 식물도 아닌 것이 광합성 비스므리 하는게 우스워 보였을수도 있겠지만.
치앙마이의 4시를 만나고 나서 행복해지면,
다시 가만가만 발걸음을 옮겨 골목골목길을 목적도 없이 돌아다녔다.
너무너무 조용해서 날 위해 존재하는 길이라는 행복한 착각에 빠지는 골목길들.


갑자기 길가에 쭉뻗어 진로방해하는 고양이들 빼고 ㅠㅠ


다양한 물품들이 끝도 없이 진열되는 치앙마이 선데이마켓,
이 재미난 백화점도 치앙마이의 선물 중 하나다.
하나하나 개성이 담긴 조그마한 물품들의 사랑스러움과,
치앙마이의 향취를 가진 사원에서 펼쳐지는 먹거리장터와, 사원의 맛.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보다, 그곳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다.
쇼핑보다는 다양한 군중들을 한발짝 떨어져서 훔쳐봐도(!) 누구도 뭐라하지 않아서였을까?




모자짜는 할아버지에게선 장난끼 묻은 장인의 숨결을,
이른 오후부터 늦은 저녁까지 노래하는 청년에게선 뜨거운 열정을,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악기를 연주하는 꼬마에겐 표현하기 힘든 슬픔을..
산다는 것,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일일까.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짊어가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보며
어쩔때는 정말로 꾸벅, 인사를 하기도 하면서 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웠다.


그리고 또 하나 , 이미 트레킹이라면 할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는 소중한 이유 때문에 하게된 트레킹...
사실 트레킹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오르면서 흘리는 땀이 좋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조그마한 산들과
드문드문 놓인 돌들이 좋았다.
내가 잘 자리에 소리없이 다가와서 세상모르고 자는 고양이도 귀여웠고,
내가 사랑해 마지않는 태양이 내 눈앞에서, 내 하늘을 붉게 붉게 물들이며 조용히 숨는 모습도 소중했다.

패키지라는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다.
내가 탈 코끼리라며 보여준 코끼리의 눈을 보는순간,
더군다나 날카로운 송곳들에 찔려 상처가 난 코끼리의 귀를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날 뻔했다. 왜 , 어째서 우리들은 이렇게 까지 이기적인가.
그때부터 모든일정에서 “그만 집으로 가고 싶다” 했지만
사람들의 모든 일정이 끝날 때 까지, 나 역시 모든걸 함께해야 했다.

사실,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참 내가 부끄럽다.
입으로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도 나는 그네의 삶을 뺏고 있는 관광객에 불과한 거니까.
아이의 목에 차여진 쇠사슬(내눈에는 그렇게 보인다)을 당장에라도 달려가 풀어주고 싶었다.
소수민족의 아이덴티티? 이들에게 이런게 남아 있을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평생 몸에 이고가야할, 어쩌면 짐일지도 모르는 쇠사슬을 채우는 것은 민족적 아이덴티티일까? 그냥 나 같은 관광객을 위한 숭고한 인간의 희생 아닐까?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다.
인권을 차치한다면, 차라리 그들이 마이너이길 원한다면,
그들 그대로의 삶을 보전해 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관광객이 올 시간에 맞춰 입술엔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고 번쩍번쩍한 금 쇠사슬을 채워, 관광객이 셔터를 들이댈라손 치면 포즈를 취하는 그네에게 삶의 의미가,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을까.
마치 내가, 그 곳에 서있는 내가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것같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아이의 눈망울은 , 지금봐도 콧잔등이 시큰해진다. 그때도 마음이 아팠고
지금, 내가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절망으로만 다가온다.

나는 게으른 여행자라, 사실 사원같은걸 잘 보는 편은 아니다.
어딜가나 우리나라만큼 예쁜 절을 못봐서 일수도 있고.. ^^;
하지만 도이수텝을 선택한건, 내가 일부분으로 아는 치앙마이를 더 넓게 감싸볼 수 있다는 떨림때문이었다.
계단을 한발자욱씩 밟아가고, (사원은 안들어갔다^^;) 쪼로로 달려가서 보는 순간 불어오던 맞바람.
앞머리를 시원하게 넘겨주는 치앙마이의 바람과 구름, 하늘빛에 담겨져 있던 치앙마이의 모습..
내 가이드북은 도이수텝이 별 세 개짜리 관광지라 했다.
사실 종종, 가이드북은 싸가지가 없다. 별 세 개짜리에서는 은연중, 별 세 개짜리의 감동을 받기를 강요한다.
그래 인정해서, 도이수텝은 별 세 개짜리였다. 그래도 4시의 치앙마이는 별 백개짜리다.
사람마다 도시를, 관광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이하다.
가이드북을 떠나, 길 곳곳에서, 각자의 시간속에서 별 백개짜리의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을 찾는다면 그만 아닐까.

오늘 4시에, 나는 그때처럼 아메리카노를 시켜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나 이곳에선 따스한 감쌈도, 빨간 썽태우도, 귀여운 소리를 내며 달리는 뚝뚝도 없는 서울 한복판 명동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다가와 나는 또 한번 씁슬했다.
도시가 특별한 향취를 가지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다.
나는 오늘 4시에, 정말, 정말이지 치앙마이가 눈물나게 그리웠다.
그 향기를 맡고, 그 공기와 함께했고, 그 다홍빛의 햇볕을 볼 수 있었음에, 느낄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4시의 치앙마이, 정말 나는 너를 가슴 깊숙이 사랑해- 꺼내보면 가슴이 너무나 저릿해서 쉬이 꺼내보기 어려울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