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과 예금 (퍼온글)
킁타이
6
464
2012.10.04 14:58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권장하고 당부하는 이런저런 주문이 꽤 많았다. 대통령부터가 그러하니 국가경영의 각 부문을 책임진 장관들도 마찬가지였다.
혼분식을 하자, 나무를 심자, 자연보호를 하자,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하자는 등 갖가지 주문에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무슨 기공식이나 준공식이 요란하게 벌어져 나라가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론 잘살아 보자는 마라톤 같은 강행군의 대열에 동참하는 국민 저마다의 심신이 어지간히 고달팠던 것도 사실이다.
허리띠를 조이고 땀과 눈물을 쏟던 60년대에 농촌에선 은행 통장이라는 것을 깜깜 모르고 보릿고개에 짓눌려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저축’ 얘기가 튀어나왔다.
박 대통령은 먼저 65년 2월 청와대 전직원에게 저축통장을 만들고 매월 봉급 중 액수에 제한 없이 저축을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67년 1월 연두교서에서 지방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척박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러했고, 국내 자본이 빈약해 외국차관을 빌려와야 하는 형편에서 그래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뒷받침이 되는 산업자본은 먹을 것 덜 먹고 쓸 것을 덜 쓰고 은행에 돈을 넣어주는 저축, 가장 믿을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해 67년 10월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문을 열었다. 개업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한 영업부에 제일 먼저 찾아온 고객이 당시 김용환 재무부 이재국장이었다. 그가 박 대통령의 개업축하 정기예금을 제1호로 넣었다.
이후 지방은행들이 속속 문을 열어 이듬해 68년 충청은행의 창립 때도 정기예금 통장 1호의 주인이 박 대통령이었고, 또 그해 광주은행이 문을 열었을 때는 김성환 은행감독원장을 통해 10만원을 6개월 정기예금으로 맡겼다.
이어 69년 2월에는 부산시를 연두순시한 후 부산은행에 들러 직접 2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하고는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며 예금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묻고 이모저모를 살폈다.
또 그 무렵 문을 연 전북은행의 첫번째 정기예금 통장의 주인도 박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지방은행의 개업을 축하하는 일련의 예금들이었다.
대통령이 그러하니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는 물론이요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지방 유지들이 어찌 가만 있을 것인가.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뒤따를 것은 불문가지.
당연히, 박 대통령은 정기예금 기간만료 후에 돈을 찾지 않았다. 10.26 후에도 상속 유가족들도 인출을 바라지 않았다. 은행들은 대통령 고객계좌를 휴면계좌로 편입시키고 오늘까지 거의 반세기가 가까운 세월 동안 화폐가치에 따라 불어날 만큼 불어난 이자까지 모두 은행 사료(史料)로 치부, 이 땅의 서민들과 더불어 근검절약하는 ‘서민 대통령’의 깊은 뜻을 기리는 징표로 보관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 이후 오늘까지의 동시대인들은 돈에 관한 한 대통령 박정희는 깨끗하고 청렴하다고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자랑은 못된다. 물욕(物慾)에 대해 자기 분수를 아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상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의 젊은 시절 문경소학교 교사생활을 접고 만주에 가서 군생활을 하다가 일본 육사를 다녀와 푼푼이 모은 돈을 어머니(백남의 여사)에게 드렸는데 해방이 되어 돌아와 보니 그 돈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는 것. 군시절 한때 동거생활을 했던 이현란이라는 여인은 구미 생가에 가보더니 사람이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 집이더라고 말했다. 그런 집의 어머니와 그 아들이었다.
박 대통령이 돈 씀씀이에 얼마나 꼼꼼하고 지독했는지를 그 시대의 청와대 사람들과 공직자들은 익히 알고 있다. 고속도로를 닦을 때나 큰 산업단지를 만들 때 돈 없는 설움을 가장 혹독하게 겪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었으니까.
저축은 잘 살아보자는 실사구시의 표본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선(善)이다.
박정희 시대에 국부(國富) 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도자 자신이 근검절약 같은 기초적인 선에 충실했고, 권력을 쥐었으되 나무를 심거나 혼분식을 하거나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는 권력의 선용(善用)으로 충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때 그 시절에 지금 국민을 울화통 터지게 하는 저축은행사건, 서민을 등쳐먹는 그 더러운 권력부패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과 인품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시대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밥을 안먹어도 잠을 못자도 전혀 힘든 줄을 몰랐다.”
박봉에 야근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해도 공직사회의 구석구석을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게 감싸주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보람과 기쁨으로 여한없이 일했다고들 말을 한다.
박 대통령 밑에서 일하다가 3선개헌에 반대해 야당으로 간 예춘호라는 사람이 있다. 기자들이 그에게 꼭 묻는 말이 있다. 박 대통령 어떤 사람이냐고.
어느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의 첫마디가 아주 간명했다.
“박 대통령 애국자입니다.”
혼분식을 하자, 나무를 심자, 자연보호를 하자,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하자는 등 갖가지 주문에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무슨 기공식이나 준공식이 요란하게 벌어져 나라가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론 잘살아 보자는 마라톤 같은 강행군의 대열에 동참하는 국민 저마다의 심신이 어지간히 고달팠던 것도 사실이다.
허리띠를 조이고 땀과 눈물을 쏟던 60년대에 농촌에선 은행 통장이라는 것을 깜깜 모르고 보릿고개에 짓눌려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저축’ 얘기가 튀어나왔다.
박 대통령은 먼저 65년 2월 청와대 전직원에게 저축통장을 만들고 매월 봉급 중 액수에 제한 없이 저축을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67년 1월 연두교서에서 지방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척박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러했고, 국내 자본이 빈약해 외국차관을 빌려와야 하는 형편에서 그래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뒷받침이 되는 산업자본은 먹을 것 덜 먹고 쓸 것을 덜 쓰고 은행에 돈을 넣어주는 저축, 가장 믿을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해 67년 10월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문을 열었다. 개업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한 영업부에 제일 먼저 찾아온 고객이 당시 김용환 재무부 이재국장이었다. 그가 박 대통령의 개업축하 정기예금을 제1호로 넣었다.
이후 지방은행들이 속속 문을 열어 이듬해 68년 충청은행의 창립 때도 정기예금 통장 1호의 주인이 박 대통령이었고, 또 그해 광주은행이 문을 열었을 때는 김성환 은행감독원장을 통해 10만원을 6개월 정기예금으로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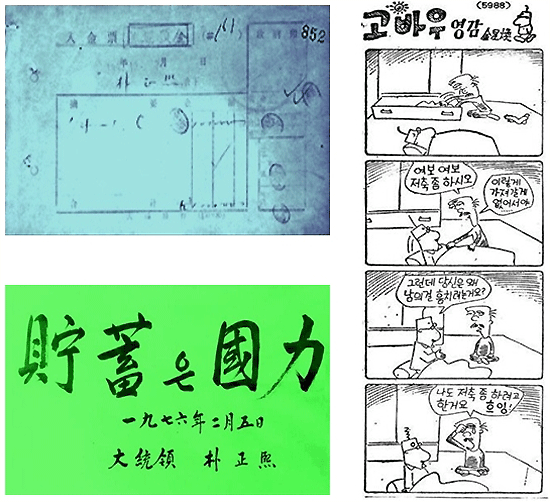 |
|
◇ 지방은행 제1호인 대구은행 금융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박 대통령 예금 전표(사진 왼쪽 위). 박 대통령 휘호 (사진 왼쪽 아래). 저축의 애환을 그린 동아일보 고바우 만화(1973년 10월 18일). |
이어 69년 2월에는 부산시를 연두순시한 후 부산은행에 들러 직접 2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하고는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며 예금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묻고 이모저모를 살폈다.
또 그 무렵 문을 연 전북은행의 첫번째 정기예금 통장의 주인도 박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지방은행의 개업을 축하하는 일련의 예금들이었다.
대통령이 그러하니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는 물론이요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지방 유지들이 어찌 가만 있을 것인가.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뒤따를 것은 불문가지.
당연히, 박 대통령은 정기예금 기간만료 후에 돈을 찾지 않았다. 10.26 후에도 상속 유가족들도 인출을 바라지 않았다. 은행들은 대통령 고객계좌를 휴면계좌로 편입시키고 오늘까지 거의 반세기가 가까운 세월 동안 화폐가치에 따라 불어날 만큼 불어난 이자까지 모두 은행 사료(史料)로 치부, 이 땅의 서민들과 더불어 근검절약하는 ‘서민 대통령’의 깊은 뜻을 기리는 징표로 보관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 이후 오늘까지의 동시대인들은 돈에 관한 한 대통령 박정희는 깨끗하고 청렴하다고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자랑은 못된다. 물욕(物慾)에 대해 자기 분수를 아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상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의 젊은 시절 문경소학교 교사생활을 접고 만주에 가서 군생활을 하다가 일본 육사를 다녀와 푼푼이 모은 돈을 어머니(백남의 여사)에게 드렸는데 해방이 되어 돌아와 보니 그 돈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는 것. 군시절 한때 동거생활을 했던 이현란이라는 여인은 구미 생가에 가보더니 사람이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 집이더라고 말했다. 그런 집의 어머니와 그 아들이었다.
박 대통령이 돈 씀씀이에 얼마나 꼼꼼하고 지독했는지를 그 시대의 청와대 사람들과 공직자들은 익히 알고 있다. 고속도로를 닦을 때나 큰 산업단지를 만들 때 돈 없는 설움을 가장 혹독하게 겪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었으니까.
저축은 잘 살아보자는 실사구시의 표본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선(善)이다.
박정희 시대에 국부(國富) 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도자 자신이 근검절약 같은 기초적인 선에 충실했고, 권력을 쥐었으되 나무를 심거나 혼분식을 하거나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는 권력의 선용(善用)으로 충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때 그 시절에 지금 국민을 울화통 터지게 하는 저축은행사건, 서민을 등쳐먹는 그 더러운 권력부패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과 인품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시대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밥을 안먹어도 잠을 못자도 전혀 힘든 줄을 몰랐다.”
박봉에 야근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해도 공직사회의 구석구석을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게 감싸주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보람과 기쁨으로 여한없이 일했다고들 말을 한다.
박 대통령 밑에서 일하다가 3선개헌에 반대해 야당으로 간 예춘호라는 사람이 있다. 기자들이 그에게 꼭 묻는 말이 있다. 박 대통령 어떤 사람이냐고.
어느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의 첫마디가 아주 간명했다.
“박 대통령 애국자입니다.”
작가 김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