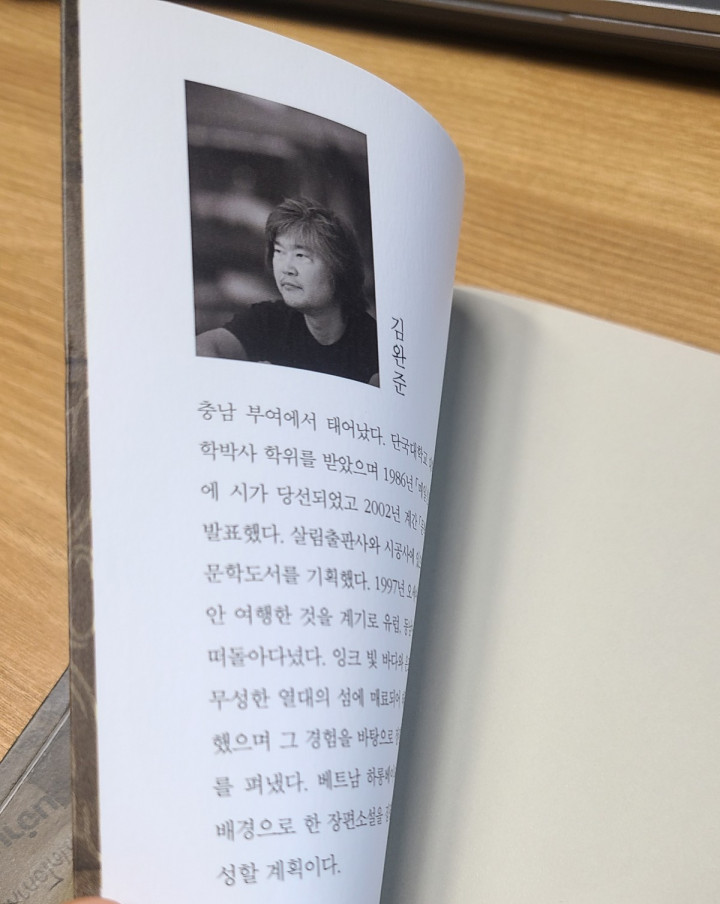필리핀님의 <열대의 낙원>을 읽고...
바이러스 이전에 태사랑에 올라오던 질문 중에
왜 여행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비행기타고 외국은 갔는데,
가이드북이나 태사랑에서 추천한 루트도 가봤는데,
이게 뭔가하는 현타가 오는 경험.
자취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홀로 있는 외로움이
사람 심리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안다면,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는 여행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외로움도 떨치고 안전도 도모하겠지만,
첫 여행이거나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다니는데
사교성도 그리 크지 않다면,
외로움과 두려움을 쉬이 극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이 외롭고 두려운 걸 왜 다른 나라에 와서 하고 있지?’
우리는
일상에서 누구나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있는 척과 인체 하는 모습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학연, 지연 같은 연줄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행자가 항상 일상처럼 함께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집에서 들고나온 가면들을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게 느끼게 합니다.
솔직할수록 교감하고 공감하기가 쉬워지죠.
현실에서 대체 내가 누구든지 간에,
여행지의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행자인 나는,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외로움을 덜어주는 우연히 만난 동행자가 그냥 고마운 거죠.
그 인연이 여행지에서 끝난다 해도 말이죠.
그런데,
여행을 오래 하고 많이 하다 보면
두려움은 자신의 노하우로 안전함을 도모하게 되고
외로움은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극복하는 신공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우연히 마주치고 동행하길 바라는 여행자들이 귀찮아집니다.
혼자 있으면, 모든 시간을 나의 여행에만 쏟을 수 있으니까요.
국경은 지도위의 선이고 언어는 행동의 변주일 뿐,
내 몸을 실은 버스는 출렁여도
몸속 내 마음은 바람멎은 호수마냥 잔잔합니다.
<열대의 낙원>속 송민하는 아마도 그런 인물인 듯 싶더군요.
짧은 단편이라 쌍둥이 송민수의 현재와의 비교가 그렇게 명확하고 비교적이지 않아서
뭐라 유추하기는 힘드나,
송민수의 성욕은 배설이라는 개념에 초점이 맞춰진 듯이 표현되고
송민하의 성욕은 생명이라는 결과물로 민수와 마주친 모습에서,
민수가 혹시나 바뀐 여권사진 마냥 사법고시 내려놓고
빠이에 머물지는 않을까는 뉘앙스도 느껴지는 터라,
조금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여행고수(?)의 삶을
작게나마 항변하는 건 아닐까는 느낌더 받았습니다.
더욱이 송민하는
철저히 이방인이고 타자로서 맺은 인연이었으나,
쏨과 태어난 딸에게서 정착의 소명을 받고 거부하지 않았으니
윤리적 당위성도 있구요.
낳고 알고 있으나 내팽겨쳐져 시골 촌구석에서
쏨땀만 먹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 게 현실이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처지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루앙프라방 가는 길>은 읽은 남자들 99%는 뜨끔했겠다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분도 그러더군요. 코로나 이전에 회사에서 방콕파타야를 1년에 한 두 번은 갔었다고. 가서 뭐하냐니까 밤문화 때문이라고.
동남아에서 욕망의 방종을 즐겨본 남자들이라면 마음 한구석에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검사하고 떨쳐내기도 하고 찜찜하니 그냥 살기도 하고, 실제로 태국갔다가 검사받고 양성판정받은 사람들도 있구요.
자살여행인지는 드러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크나큰 대가라고 항변하는 사장의 유서에는 공감하기 힘들더군요.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결정과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실수로 치부하는 건, 엄청난 자기 연민이고 자기 합리화는 아닐는지.
방비엥에서 돌아간 다이아나보다 루앙프라방까지 갔다가 거기서 끝낼지 다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여정이, 그 병을 天刑이라 여기는 건 아닐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다이아나는 자기 생 전체를 얘기하는데, 주인공은 왜 극단의 끝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걸까 싶어서요.
이 두 작품에 대한 인상이 강해 감상문 써 봅니다.
좋은 작품 잘 봤습니다.